| 촛불 켠 ‘책사회’ 송년 시낭송회 | |
| 최재봉의 문학풍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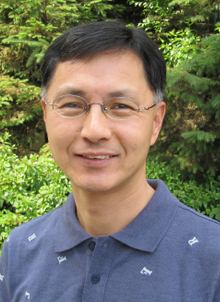 한 해를 떠나 보내는 데에 반드시 박래품 카운트다운과 보신각 타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어떤 이들은 한데 모여 시를 낭송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송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29일 저녁 7시 서울 대학로 책사회(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강의실에서 있었던 시 낭송회 얘기다.
한 해를 떠나 보내는 데에 반드시 박래품 카운트다운과 보신각 타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어떤 이들은 한데 모여 시를 낭송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송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29일 저녁 7시 서울 대학로 책사회(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강의실에서 있었던 시 낭송회 얘기다.“저무는 해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밤/ 촛불을 켜고/ 거친 세월의 한 토막과 작별하는/ 송년 시 낭송회”
책사회 송년 시 낭송회장에는 이런 플래카드가 걸리고, 그 아래로는 크고 작은 초 십여 개가 불을 밝히고 섰다. 의자와 방석을 합친 138석 자리가 꽉 찼음은 물론 중앙과 좌우 통로에 앉고 선 이들이 다시 십수 명이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책사회 시 낭송회가 어느덧 인기 송년 이벤트로 자리잡았음을 알게 했다. 올해 시 낭송에는 모두 열여섯 명이 참여했다. 진행을 맡은 소설가 하성란, 역시 소설가인 배수아, 시인 도종환·이진명·박남준, 화가 황주리, 그림책 작가 권윤덕, 번역가 안선재, 연극배우 박상종·김재엽, 그리고 교사와 학생, 직장인 등.
올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다룬 역작 <꽃할머니>를 내 좋은 평을 받았던 권윤덕은 탄광촌 아이들의 시 두 편을 읽었다. “삼 학년 때/ 밥을 안 싸 가지고/ 갔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집으로 왔다./ 집에 오니 밥은 없었다./ 나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아무나 때리고 싶었다.” 사북초 5학년 김상은 학생의 <화난 내 얼굴>이라는 시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렸던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자괴감 속에 돌아보게 했다.
매력적인 저음의 건축가 윤의식이 낭송한 김광규 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다름 아닌 대학로의 세밑을 배경 삼아 씌어진 탓에 더욱 큰 울림을 주는 듯했다.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안선재 서강대 명예교수가 영어 원문으로 읽은 토머스 하디의 시 <어둠 속 지빠귀새>(The Darkling Thrush)는 하디가 1900년대의 마지막 날에 쓴 시로 알려져 있다. “땅의 날카로운 모양새는/ 쭉 뻗은 세기의 시체인 듯하”고 “지상의 모든 영혼이/ 나와 한가지로 그 열기를 잃은 듯”한 때,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 머리 위 황량한 나뭇가지 사이에서/ 온통 가슴을 쏟아내는/ 거리낌 모르는 기쁨의 저녁 노래였다./ 늙은 지빠귀새 한 마리, 센 바람에/ 깃털 쓸리는 약하고, 야위고, 작은 몸으로/ 이렇게 제 혼백을 온통 내던지는 것이었다./ 이 부풀어오르는 어둠 위에.”(번역 김길중) 깜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근거나마 찾고자 하는 안간힘이 2010년을 보내고 2011년을 맞는 시 낭송회의 분위기에 맞춤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성복의 시 <남해 금산>을 들려준 하성란이 주최 쪽을 대신해 인사말을 했다. “눈이 오면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어지고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도 없어집니다.” 창 밖으로는 한 해의 치부를 가리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고 있었다. 누군가 조그맣게 발음했다. 아듀, 경인년!